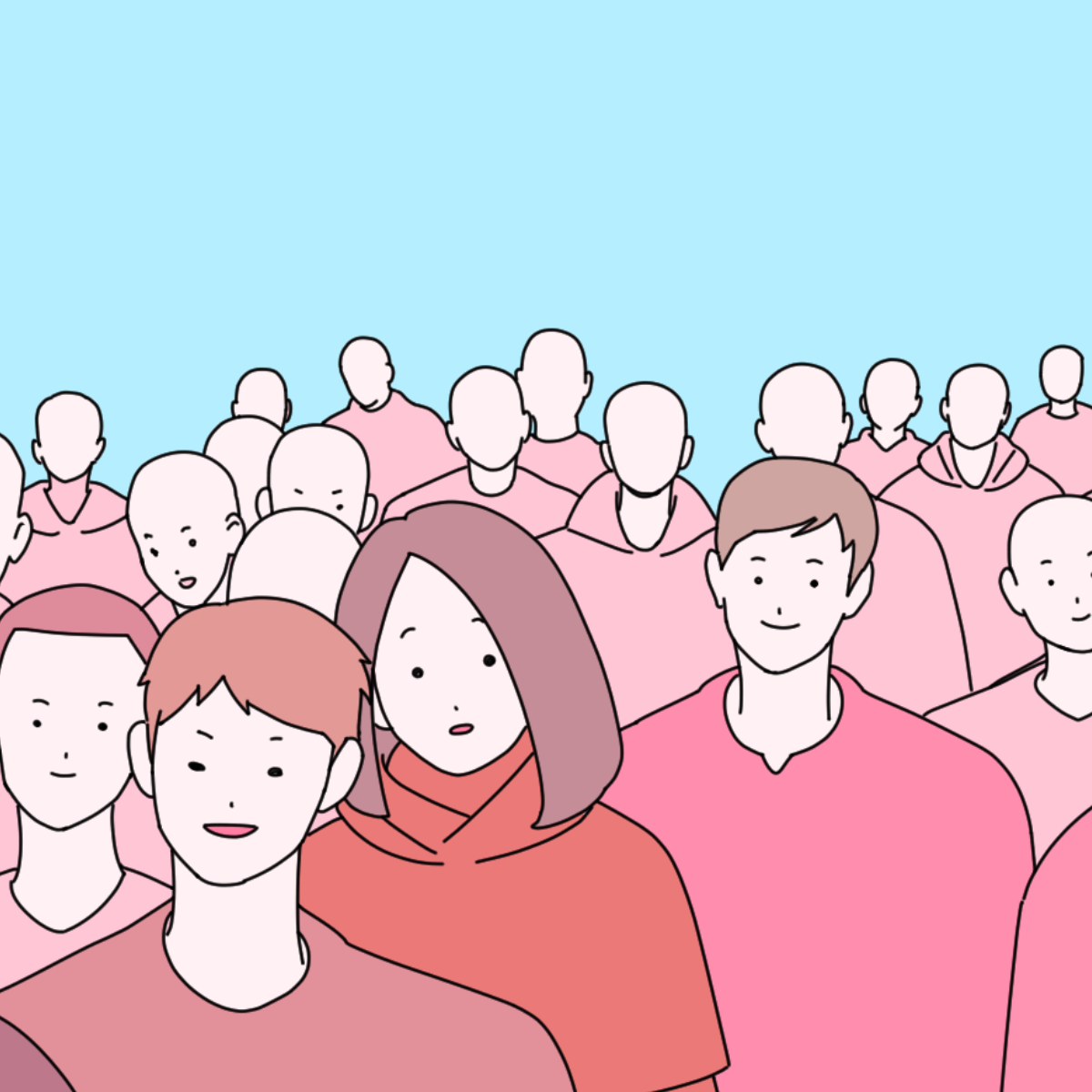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책임지지 않는 부모를 향한, 한 소년의 슬픈 소송
가버나움은 ‘카파르나움’,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 도시 이름이기도 하다. 나딘 라바키 감독의 영화 <가버나움>을 보면, 기적을 바라게 된다. 15년간 내전을 겪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위로 카메라가 난다. 다닥다닥 붙은 건물 사이로 카메라는 곤두박질쳐 한 아이의 시선을 따라간다. 자인,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열두 살쯤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출생증명도 없는 이 아이가 부모를 고소한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자인한테 동생이 대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 명이 한 방에 뒤섞여 잔다. 소년은 생존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이다. 슈퍼에서 일하며 남은 채소 따위를 가져와 동생들을 먹인다. 자기 몸만 한 가스통을 배달하고 길에서 주스를 판다. 자인은 견딘다. 적어도 여동생 사하르와 노을을 볼 수 있으니까.

열한 살 사하르가 생리를 시작한 날, 자인은 동생 속옷에 묻은 피를 씻어내면서 “들키지 말라”고 당부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닭 몇 마리를 받고, 사하르를 슈퍼 주인과 ‘결혼’ 시켜 버린다. 부모에 맞서다 가출한 자인은 에티오피아 출신 불법체류자 라힐을 만나고, 라힐의 아기 요나스와 함께 살게 된다. 장에 간다고 나선 라힐이 구금돼 버리자, 아기 요나스를 돌볼 사람은 자인밖에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기 요나스, 불법입양을 주선하는 한 어른은 “요나스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와 같다”라고 한다. “하물며 케첩에도 제조일자가 있는데...이 아이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해.”
카메라는 집요하리만치 자인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에 맞춰 세상을 비추고, 관객은 자인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자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가 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하는 ‘어른’이자, 피부색이 다른 요나스를 자기 친동생이라 소개하며 “엄마가 얘를 가졌을 때 커피를 많이 마셨어”라고 둘러대는 ‘아이’다. 가난에 짓눌려 납작해진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입체적인 ‘주체’다.

영화가 끝날 때,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본다. 자인을 연기한 소년의 진짜 이름은 자인 알 라피아다. 시리아 다라에서 태어난 난민 소년이다. 베이루트 시장에서 배달 일하다 캐스팅됐다. 이 영화 덕에 자인의 가족은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노르웨이에 정착했다. 이제 자인은 학교도 다닌다. 제작진은 가버나움 재단을 세워 출연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기적’은 ‘기적’일 뿐, 소수가 누리는 구원이다.
영화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놓는데, 그 부모도 한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이였다. 지금은 수도관이 터진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생긴 벼랑 끝 어른이다. 아이의 불행은 오로지 가난하고 부도덕한 부모 탓일까? 자인 엄마는 법정에서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자살했을 것”이라며 절규하지만, 영화는 이 부모의 생존 투쟁엔 관심이 없다. 이들의 절망에, 사회는, 영화에서 구원의 손길처럼 그려지는 서구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이 영화가 빚은 진짜 기적은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 아이들의 슬픔을 관객이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레바논 영화는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관객 14만 명을 끌어모았다. 이 14만 명은 적어도 두 시간 동안 자인이었다.
글 김소민 자유기고가 | 사진 그린나래미디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