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에볼라...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
대서양.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맞닿은 대서양은 오랜 동안 눈물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후추해안, 곡물해안이라 불렀던 몬로비아 곶에서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뒤 해방 노예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1947년 아프리카 첫 공화국을 세웁니다. 라이베리아,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다시 13년에 걸친 내전, 4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 에볼라가 할퀴고 갔습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는 가난과 시련의 나라만은 아닙니다.

내전의 한 가운데, 독재자에 맞선 천 명의 흰 옷 입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난민이자 가정폭력 생존자, 여섯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레이마 그보위는 맨손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 외침의 결실로 평화운동가 엘렌 존슨 설리프는 아프리카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그보위와 설리프 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에서 증오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다진 공로로 2011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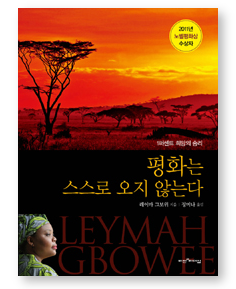
▲ 노벨 평화상 수상자 레이마 그보위 자서전.
그리고 그보위와 설리프의 ‘딸’들이 라이베리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현 상황을 말하는 수치들은 아직 암울합니다. 조혼, 10대 임신율, 중학교 졸업률 등을 척도로 삼은 여아기회지수 144개국 중 135위, 기대수명, 교육 기회, 일인당국민소득 등을 본 인간개발지수로는 186개국 중 177위. 초등학교 졸업률 여자아이 47%, 남자아이 62%. 하지만 아프리카 여자아이들 학교보내기 ‘스쿨미’는 2012년부터 이 딸들의 저력과 꿈을 믿고 지지합니다. 이제까지 학교 네 곳, 학교밖 아이들 지원하는 릴라센터 세 곳을 새로 만든 것은 그 한 예입니다. 지난 해 11월 말~12월 초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이어 이웃 나라 시에라리온으로 넘어갑니다.
행상으로 가득찬 거리, 도너츠 파는 소녀
물봉지, 튀긴 과자, 전화카드 낡은 신발…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 만인이 만인을 향해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흙먼지와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헤맵니다. 1989년~2003년 내전 기간 동안 고향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수도로 향했습니다. 몬로비아는 터질 듯 부풀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팔 수 있는 건 다 팝니다. 몬로비아 한 마을, 내전 전에는 닭수프 공장이 있어 마을 이름이 ‘치킨수프팩토리’입니다만 그 공장은 이름만 남기고 내전 기간 파괴돼 버렸습니다.
릴리(18)는 ‘치킨수프팩토리’ 마을을 하루 종일 떠도는 어린 행상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슬레이트집들 사이로 흘러나온 녹황색 진창이 실핏줄처럼 엉켜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머리에 도너츠 바구니를 얹고 다른 상인들과 얽혀 하루 종일 돌아 다니던 그는 지난 해 파란색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1층 건물 앞을 여러 번 맴돌았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도너츠 열기까지 섞여 릴리 얼굴은 땀 범벅이었습니다. 릴리는 그 땀방울 사이로 그 건물을 곁눈질했습니다. ‘릴라센터’. 벌써 며칠 째인데 선뜻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윈스턴. “우리 예쁜 아가의 이름”.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16살 릴리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내륙의 시골 마을, 부모님은 자급자족 농부, 릴리는 7명 형제 자매 가운데 둘째, 하루에 한끼 먹기도 빠듯하니 학교는 4학년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친구, 친절했던 그는 릴리가 임신하자 사라졌습니다. 아기에게는 쌀뜨물 밖에 먹일 수 없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부모의 냉대였습니다. 그렇게 릴리는 한 살배기 윈스턴을 안고 몬로비아로 와 고모집에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물봉지를 파는 고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모네 시멘트 벽은 바스러질 듯 부식됐습니다. 릴리와 윈스턴이 머무는 3평 남짓 방엔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스폰지 더미. 귀퉁이를 물어뜯긴 스폰지 더미가 릴리와 윈스턴이 자는 침대입니다. 수도, 전기, 화장실은 없는 이 집에서 릴리는 밤에 버무려 놓은 반죽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튀긴 뒤 거리에서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하루에 그가 쥐는 돈은 300라이베리안 달러(약 4천원)입니다.
지난 해 9월 릴리는 며칠 째 맴돌았던 파란 건물 ‘릴라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릴리의 일상이 바뀐 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다른 300명의 ‘릴라’ 아이들처럼 그에게 교복, 학용품 등을 지원했고, 뒤쳐진 공부를 따라가도록 보충수업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난 9월부터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초록색 치마에 하연 셔츠 교복을 입고 7시 30분까지 학교에 갑니다. 오후 1시께 학교가 끝나면 릴라센터로 와 오후 3시까지 보충수업을 듣습니다. 릴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립해서 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더 어깨가 무거워진 고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릴리가 도너츠 팔아 봤자 그 돈으로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가야죠.”

▲ 릴리와 아들 윈스턴(가운데)

▲ 릴리와 아들 윈스턴(가운데)의 방
내전에 이은 에볼라(2013~2014)로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학교를 중단해야 했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에볼라 기간엔 학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샥 스와레이 세이브더칠드런 라이베리아 교육 팀장은 “에볼라로 휴교령이 내려지고 가정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조혼이나 청소년 임신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볼라가 덮치기 전 라이베리아의 18살 미만 조혼율은 이미 37%였습니다. (UNICEF) 15~19살 출산율은 1000명당 177명이었는데 그 수치가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신, 가난 탓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릴라센터’를 세 곳 꾸렸습니다. 치킨수프펙토리에 있는 릴라센터는 그 가운데 하나로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기증했습니다.

▲ 라이베리아 학교밖 아이들 지원센터 '릴라센터' 아이들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노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보위의 후예들
지난 해 11월 29일 오후 3시, 벌써 어둑한 내부는 습한 열기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릴리는 여자아이들 30여명이 방과 후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릴리 뿐이 아니었습니다. 열한 살 와타, 아버지가 병으로 숨진 뒤 엄마도 집을 나가 홀로 남겨진 아이, 물을 팔아 하루 200라이베리안 달러(약 2천500원)를 버는 와타는 이제 다시 학교에 다닙니다. “대통령이 돼, 우리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아홉 살 빅토리아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 가수가 꿈인 빅토리아가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 왔다는 마하와, 아버지 학대 탓에 12살에 집을 나온 그는 13살에 아기를 낳았고 무작정 몬로비아로 와 물 봉지를 팔며 살고 있습니다. 검은 셔츠에 유난히 검은 눈을 가진 그는 이날 파란 집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말합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보내주세요. 오전에 아기를 맡아주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끝나면 아이 업고 물 팔아 생활비를 벌 거예요.”
이 어린 미래의 ‘그보위와 설리프’를 끌어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릴라센터 선생님 네 명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학을 봐주는 선생님 제스티나 할리(42), 애가 넷인 그는 “물 기름, 종이 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배웠어요. 내전 때는 남자애들은 군인으로 많이 끌려갔고 에볼라가 덮쳐 학교가 1년 넘게 문을 닫았죠. 아이들 미래에 교육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일을 택한 타누"제 인생은 나아지고 있어요"
학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릴라센터는 재단, 미용 등 직업 교육도 연계합니다. 지난 12월 1일 만난 알베르타 타누(25)는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습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여섯 달 전 몬로비아에 들어선 파밍턴호텔 식음료 코너에서 일 한지 한달 째입니다. 매달 150US달러, 고정수입, 이건 곧 그와 동생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릴라센터 연계로 넉 달 인턴 교육을 받은 뒤 뽑힌 자리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내 문제를 내가 풀어가고 싶어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조건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고 가족들도 돕고 싶고 여기서 시니어스태프까지 승진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요."

▲ 학교 대신 직장을 택한 알베르타
이 아이들을 보면 노벨평화상을 받은 레이마 그보위의 테드 강연이 생각납니다. “여기 한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과 뭉쳤습니다. 이 여성은 도우넛 뿐 아니라 평화를 바랐습니다. 학교에 가길 바랐습니다. 갔습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납니다."
글 김소민(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사진 김영균